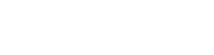시절인연(時節因緣)
페이지 정보
호수 310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09-01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지혜의눈페이지 정보
필자명 김태원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칼럼니스트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09-16 14:24 조회 679회본문
불교의 특징은 ‘절대적 구원은 없다’
스승 만나기 전 치열한 수행이 우선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10에 나오는 내용이다.
陸亙大夫, 初問南泉曰: “古人甁中養一鵝, 鵝漸長大, 出甁不得. 如今不得毁甁, 不得損鵝, 和尙作麽生出得?” 南泉召曰: “大夫!” 陸亙諾. 南泉曰: “出也!”
어느 날 육긍대부가 남전에게 질문을 던졌다. “옛날 어떤 사람이 병 속에 거위 새끼를 키우고 있었소. 거위가 점점 커지자 병의 목이 너무 좁아서 나올 수가 없었소. 자, 이제 병을 깨뜨려도 안 되겠고 거위를 다쳐서도 안 되겠는데 화상께서는 어떻게 그 새를 빠져나오게 하시렵니까?” “대부!” 남전이 그를 불렀다. 이에 육긍이 “예.”하고 대꾸하자 남전이 말하였다. “나왔습니다 그려!”
먼저 ‘南泉’은 남천이 아니라 남전으로 읽는다.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4)은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 마조도일(709~788)의 제자이자 조주종심의 스승이다. 선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선문답은 일상어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 문답이 많아서 중국의 일상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승은 교종의 승려와 달리 학문적 소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하층민 출신도 많았다. 글자를 제대로 몰랐던 6조 혜능이 선종의 대종사로 추앙받는 이유는 경전에 해박했기 때문이 아니다. 셋째 불교는 당(唐)나라 때 커다란 탄압을 받아서 교종이 크게 쇠퇴하였지만, 상류층 귀족의 후원에 의지하지 않았던 선종은 자급자족하면서 대법난 시대를 넘어왔다.
위 선문답에서 병 속의 새를 키운다는 것은 지식이 쌓이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주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첨예하게 부딪히기 마련이라 당연히 상대를 이기려는 탐욕과 그로 말미암은 분노로 판단이 흐려지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다.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개개인이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고 세계와 독립된 존재로 규정하기에 각자의 주장이나 세계관을 조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비실재론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를 독립된 개체로 규정하지 않고 관계로서 설명하기에 주장이나 세계관을 조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태어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뚜렷한 주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불교의 비실재론적 성격이 선뜻 수용되기 어렵다. 설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런 인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명상 또는 참선하는 동안 생각이 가라앉아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이를 불교에서는 의식이 폭포수처럼 흐른다고 한다. 우리의 뇌는 한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점은 뇌과학으로도 설명된다. 명상 또는 참선한 사람들의 말로는 수행을 오래 하면 그 생각의 흐름이 느려진다고 한다. 그렇지만 남전이 육긍대부를 부르고, 그가 대답하자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나로서도 이해 불가이다. 모든 선문답의 등장인물은 매우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문답은 말장난 같은 언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육긍대부는 오랫동안 수행했던 사람이고 남전에 의해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선가(禪家)에서 흔히 말하는 줄탁동시(啐啄同時)를 떠올리는 수밖에 없다. 아직 알을 깨고 나올 때가 아니라면 밖에서 쪼았을 때 알이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도 불교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절대적 구원은 없다는 점이다. 다만 스스로의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스승이 필요한 것은 시절인연(時節因緣)인 것이다. 스승을 기다리는 것 이전에 치열한 수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