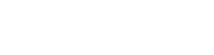마음의 이치理致를 깨치는 것이 불교佛敎이다
페이지 정보
호수 311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10-01 신문면수 4-5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페이지 정보
필자명 윤금선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작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10-13 15:03 조회 536회본문
제1장 교상과 사상 편
제3절 각종 논설
11. 현세정화(現世淨化)가 곧 내세극락(來世極樂)이 된다.
현세정화(現世淨化)가 곧 내세극락(來世極樂)이 되는 것은 윤회(輪廻)하여 다시 태어나는 까닭이니라. 그 열반(涅槃)이 단독(單獨)이 아니고 사회정의(社會正義)를 구현(具現)하는 것이 까닭이며, 개인상대(個人相對)가 아니고 사회상대(社會相對)를 하는 것이다. 속세(俗世)를 구제(救濟)하지 못하면 극락(極樂)도 없다. 현세(現世)에서 악(惡)함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극락(極樂)으로 가겠는가. 이것이 대승(大乘)이다. 염불왕생(念佛往生)보다도 자신(自身)이 실천(實踐)하고 남을 지도(指導)해야 한다. 이것이 성불(成佛)이요, 복덕(福德)이 그 중(中)에 있는 것이라 지옥(地獄)에는 소인(小人)이 들어갈 것이고 극락(極樂)엔 선지식(善知識)이 오를 것이다.
* 생활비중(生活比重)은 빈부(貧富)에 따라 다르다, 빈(貧)한 사람은 물질(物質)이 칠(七)이고 정신(精神)이 삼(三)이 되지만 조금 생활(生活)이 해결(解決)되면 정신(精神)이 칠(七), 물질(物質)이 삼(三)이 된다.
* 욕망(慾望)도 생명(生命)도 영겁(永劫)의 시간(時間) 앞에는 보장(保障) 없다.
영겁(永劫)의 시간(時間) 앞에는 어떠한 기대(企待)와 욕망(慾望)도 존재(存在)하지 못한다. 보장(保障)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自己)의 생명(生命)까지도 보장(保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영겁(永劫)을 지속(持續)하고도 남는 것은 오직 자성뿐이다.
*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 세간법(世間法)은 시대(時代)의 변천(變遷)에 따라 바뀌는 법(法). 중생(衆生)이 무상(無常)한 까닭으로 시간성(時間性)을 지닌 것이요, 영원성(永遠性)이 없다. 출세간법(出世間法)은 곧 불법(佛法), 인간(人間)의 생사(生死)에 관(關)한 법(法)이므로 영원불변(永遠不變)의 진리(眞理)의 법(法)이다. 이것은 인간(人間)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폐(改廢)할 수도 없고 수정(修正)할 수도 없다. 그 법(法)은 자연(自然)히 존재(存在)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마음의 이치(理致)를 깨치는 것이 불교(佛敎)이다. 마음의 작란(作亂)을 알고 마음의 체성(體性)을 알고 진망(眞妄)의 상쟁(相爭)을 아는 것이 불교이다.
처음 『종조법설집』을 읽었을 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두 문장이 있었다. ‘해탈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 완성을 의미한다.’, ‘현세정화가 곧 내세극락이 된다.’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총지종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글이며, 시대를 앞선 구도자이자 선각자로서 원정 대성사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해탈 열반이 단순히 윤리적인 선의 완성이나 체념, 허무, 적정, 휴지가 아니라 인간의 생애와 현실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은 불자들의 이상향을 살아 숨 쉬는 가르침으로 보여 주었다. 극락 역시 먼 훗날 개인이 가야 할 막연한 어떤 곳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차근차근 이뤄가야 할 것을 제시하여 대승불교의 자비심과 보살행이 수행의 과정이자 귀결임을 분명히 했다.
젊어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에 반감을 품은 적이 있다. 아직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왈가왈부하냐며, 능력부터 키운 다음에 사회정의를 논하라는 이야기를 많이도 들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훌륭한 말씀이 사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데 악용되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신을 닦고 집안을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을 욕하는 것으로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남 비판하는 데 핏대를 세우느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나 또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자기 성찰에 게으를 때가 많았다.
불교는 마음을 강조한다. 밖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한다. 자신을 맑게 하여 그 빛과 힘으로 타인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가르침이다. 섣부른 비판이나 성마른 비난은 아무런 힘이 없다. 제도나 시스템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이고 그 마음이 주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개인의 업으로 뭉뚱그려서는 곤란하다. 우연히 맞닥뜨린 재해나 사고, 혹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기나 갑질을 모두 전생의 업 때문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얼마 전 한 스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다. 누군가의 고통을 무조건 업의 결과로 설명하는 데 불만이 컸던 스님은 마크 엡스타인의 『트라우마 사용 설명서』에서 “붓다는 키사고타미에게 이것은 너의 업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붓다는 업을 이렇게 상투적으로 보는 관점을 명백하게 거부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업의 결과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붓다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여덟 개 중의 하나 정도가 업의 결과다.”라는 문장에 공감하여 오랫동안 그 출처를 찾았다고 한다. 드디어 챗지피티(ChatGPT)가 출처를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쌍윳따 니까야』 「백여덟 가지에 관한 법문의 품」에서 몰리야 시와까는 부처님께 개인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모두 과거 업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히 맞지 않다고 하시며 그 원인으로서 어떤 느낌은 담즙에서 생기기도 하고, 점액에서 생기기도 하며, 바람에서, 부적절한 습관과 체질에서, 계절의 변화에서, 불운한 사건에서, 우연한 피습으로부터 생기기도 하며, 업보의 성숙으로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했다고 한다.
모든 상황을 개인의 업으로 치환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자연환경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이라 해도 신체적, 심리적 요인 등 다각적이다. 무수한 우연이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니 개인의 업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의 업이 모이고 모여 공업이 된다. 사는 곳에 따라 삶의 토대는 달라진다. 자연환경에서부터 경제적인 여건, 각종 제도와 전통과 문화로 삶의 형태는 달라진다. 1950년대, 6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오랜 세월 개인의 업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공업의 크기와 무게를 도외시할 수 없다.
인연과보와 윤회에 대해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생의 일이 궁금한가? 이번 생에 받은 이것이다. 다음 생이 궁금한가? 이번 생에 짓고 있는 이것이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이고 법칙이다.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무책임하게 소비한 인류의 과보는 지금 기상이변과 각종 재난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
물질적인 여건이 너무 빈한하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누릴 경제적 토대를 충분히 갖췄음에도 여전히 경쟁과 불안에 허덕이고 물질에 더 매달리니 안타까운 일이다.
불교를 흔히 마음의 종교라고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니 매사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수준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세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지혜로써 자유롭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면서도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드는 것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사상누각 아닌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는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현세를 맑게 밝히는 것이 당장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노력이 곧 극락으로 가는 공덕의 길임을 원정 대성사는 명확하게 일러 주셨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이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좁고 거칠고 강퍅한 마음은 세상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자신이 가게 될 미래의 길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세상을 밝히는 일이 개인이 다다르고자 하는 극락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