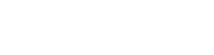신유림(神遊林)과 고대사
페이지 정보
호수 311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10-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밀교법장담론페이지 정보
필자명 정성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자유기고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10-13 15:26 조회 542회본문
우리 민족은 의식과 의례의 민족, 이를 불교로 수용한 중심에 ‘밀교’
경주에는 낭산(狼山)이 있고 이곳에 신유림(神遊林)이 있다. <삼국유사> 권5 「신주」 편 제6 ‘명랑신인’ 조에는 선덕여왕(~647) 때 당의 침공을 당해 나라가 위급해지자 명랑(明朗) 법사가 낭산 신유림에 문두루도량을 개설해 당군을 전멸시켰다. 문무왕은 이를 기려 즉위 19년(679) 이곳에 사천왕사를 지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천왕사는 기록상 최초 도량이 시설된 밀교의 성지이다.
신유림에 대해 <삼국사기> 실성이사금 13년(413)에는, “왕이 말하기를, 이 땅은 선령(仙靈)들이 내려와 노는 곳이니 반드시 복 받은 땅[福地]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왕은 그곳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명을 내렸다”라고 하여 명칭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신유림에서 벌어지는 전통 종교와 불교의 긴장에 대해 양자를 친근하게 만든 중심에 밀교가 있다. 별 신앙이나 용왕, 산신 신앙, 도량이나 의례 등은 밀교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전통 신앙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종교, 문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은 단일 혈통을 지속한 것이 아니라 주변 혈통과 집단의 융합과 이산을 통해 유전자나 유물에서 일관된 방향이나 흐름을 보이는 집단과 문화이다. 온전한 단일 민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러한 주장은 특정 지배 세력이 등장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사마천의 <사기(史記)>도 한족 중심의 역사를 재편하면서 우리 민족의 흔적을 지우고 있고, 그와 동일한 행태는 명나라와 현대 중국에 의해 반복되었다. 서구 사학자들은 파미르고원을 시작으로 요하 문명,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인류 유전자의 이동 경로와 비파형 동검, 빗살무늬토기, 옥 유물을 연구하였다. 이와 동일한 유물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다. 서구 학자들은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 파미르고원에서 발흥해 요하 지역, 한반도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가리켰다.
종교와 관련이 깊은 유적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4000년경에 형성된 홍산 문화, 또는 문명이다. 1979년 중국 조양시 지역의 발굴을 통해 종교, 제사 유적지를 확인하였고, 1984년 조양시 우하량(牛河梁) 발굴에서는 여신묘가 발굴되어 시선을 끌었다. 여신상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했으며 개중에는 크기가 실제 사람 크기의 3배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이외 우하량 유적은 무덤과 제단, 신전을 갖춘 대규모 유적군을 형성하며 명백한 지배층과 제사의 흔적을 남겼다.
학자들은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여신묘는 종묘(宗廟)로서 특권 계급만이 접근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여신묘에는 많은 곰 뼈와 곰형 옥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은 곰 토템과 관계가 깊은 지모신(地母神)으로서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웅녀(熊女)로 판단한다. 이러한 여신상은 한반도의 함북 농포동, 서포항, 농포동 등에서도 발견된다. 주목할 것은 여신이 취한 자세로서 선정, 혹은 요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는 하늘과 교감하고 소통하려는 경건한 여사제의 형상을 짐작케 하며, 고대 사회 하늘과 소통했던 샤먼의 지위가 높았던 사실을 반영한다. 여신을 웅녀로 본다면 여신은 삼칠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햇빛을 견디면서 하늘의 시험을 견딘 부단한 곰의 수행을 나타낸다. 동서남북에 배치된 남신은 그 크기로 보아 동서남북 공간을 주재하던 신격이나 수호신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우리 민족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신라는 불교의 수용이 가장 늦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는 전통 신앙을 지지하는 완고한 지배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 신앙은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다양한 신화를 통해 표현하며 이것은 지배체제에 권위를 부여하는 일관된 방식이다. 신유림을 하늘이 인간의 현실을 왕래하며 교감하는 현실적 존재로 표현한 설정은 단군신화의 그것과 동일하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의상과 원효의 불교 연구는 전통을 뒤바꾸는 혁신적 사고를 신라인에게 부여하였다. 신화를 벗어난 심오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세련된 국가 윤리관을 보여주는 불교는 신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이끌었고, 무려 백여 년이 지나 신라도 그 길을 따랐다.
요하 문명의 유적은 제사와 의식, 계급, 종교 양식이 존재했던 민족 정체성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은 의식과 의례의 민족이며, 이를 불교로 수용한 중심에는 밀교가 존재한다. 밀교의 세계관은 인도 종교와 습속의 수용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최후에는 인간의 성불을 도모하는 세련된 관상과 의궤로 완성된다. 밀교는 초기 종교의 원시성과 인간 완성이라는 양면이 공존하며 그러한 정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 공존에 어느 하나를 버리거나 선택할 필요는 없다.

사진=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신장상(경주박물관 소재 공공누리 저작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