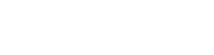해탈은 생사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대자유
페이지 정보
호수 312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11-01 신문면수 6-7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함께 읽는 종조법설페이지 정보
필자명 윤금선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작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11-10 15:01 조회 379회본문
12.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동시(同時)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불법(佛法)이다.
사람들은 다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말하나 둘은 양립(兩立)할 수 없는 모순적(矛盾的)인 개념(槪念)이다. 민주국가(民主國家)가 가장 중요시(重要視)하는 것은 자유(自由)이다. 그런데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은 일치(一致)하지 않는다. 인간(人間)이 자유(自由)로우면 불평등(不平等)하여진다. 그 불평등(不平等)을 제거(除去)하기 위(爲)해서 통제(統制)하면 부자유(不自由)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에서는 평등(平等)을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자유(自由)를 통제(統制)한다. 그런데 가장 자유(自由)스러운 사람은 걸인(乞人)이요, 가장 평등(平等)한 곳은 감옥(監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걸인(乞人)이 되는 것과 감옥(監獄)에 가는 것을 원(原)치 않는다. 그러나 불교(佛敎)는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해탈(解脫)을 통(通)하여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한꺼번에 얻는다. 불교(佛敎)처럼 자유(自由)스러운 것이 없고 평등(平等)한 것이 없다.
인류가 추구하는 근본 가치는 인권이고, 이는 자유와 평등으로 구현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자유에 방점을 두면 불평등해지기 쉽고, 평등에 주안점을 두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제한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극한으로 맞선 적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제도는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원정 대성사께서는 해탈을 통해서, 양립하기 어렵고 자칫 모순적인 자유와 평등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해탈이 자유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은 얼핏 이해되지만, 평등과는 어떻게 연관될지 뚜렷이 다가오지 않았다.
자유와 방종은 경계가 모호하다. 청소년기에 어른의 간섭과 제약을 거부하며 알아서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자칫 치기 어린 반항이나 방황에 그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인생관이 정립되는 법이니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의 자유가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빼앗기도 한다. 제멋대로인 누군가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수습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자유란 처음부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나만 해도 그렇다. 빡빡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휴식과 재충전을 고대하면서도, 막상 그런 날이 오면 어영부영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고 꽤 진지하게 준비했던 계획들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평소에는 정해진 일과가 있고 주어진 업무가 있어 어쩔 수 없다 해도 모처럼의 여유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맨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시간을 쓸 줄 모른다.
시간뿐인가? 내 마음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 맛있고 예쁘고 멋진 것에 마음이 가면 내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싫은 행동, 미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나 종일 괴롭다. 떨쳐내려 하면서도 떨쳐버리지 못한다. 내 마음도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내 의지와 자유로 한단 말인가?
불교의 해탈은 제도나 규칙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협소한 자유가 아니다. 생사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이니 그야말로 대자유이다. 나를 규정하거나 가두는 바깥의 구속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속박을 끊어야 생사와 윤회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옛 스님들은 해탈한 도인의 일상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라고 표현했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결코 만만한 경지가 아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입이 심심해서, 단 게 당겨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먹는다. 이미 배가 찼는 데도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지 못한다. 졸리고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한다. 눕기만 하면 온갖 번뇌 망상이 창궐한다. 다음날을 걱정하며 애써 잠을 청하지만 그럴수록 잠은 달아난다. 욕심과 걱정과 집착과 분노 때문에 먹고 자는 일부터 엉망이다. 먹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도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볼 때면 자신이 한심하고 무기력해진다.
해탈은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다. 자연의 질서대로 살 수 있다면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이다. 성주괴공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조금 늦추고 완화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생로병사와 우비뇌고(憂悲惱苦)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해탈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리라. 과거의 업장과 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자신을 이끌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과 해탈은 어떤 관계일까? 평등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마다 생각과 가치와 지향이 다르고 능력과 취미는 물론이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르니, 일률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닌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불평등의 역사와 제도는 타개해야 할 오랜 과제이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불이, 동체대비라 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평등하다. 생명의 가치와 본질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인종과 국가와 학력과 신분 등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현실을 질타한다. 나에게 부처 될 성품이 있어 존귀하듯 우리는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법화경』에 등장하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은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탄했다. “나는 그대를 공경합니다. 감히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하실 분입니다.” 모두가 본래 부처이기에 우리는 지극히 평등하다. 그 지혜에 눈을 뜬다면 자연스레 상대를 나와 다르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인과야말로 가장 평등한 것이 아닐까? 개인이 지은 업에 따라 예외 없이 결과가 따른다면 이것이 가장 공정한 규칙인 것 같다. 인생은 어차피 자신의 몫이다. 업과 과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없애주거나 바꿔줄 수도 없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 참 공평하다. 시쳇말로 인과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한다. 오직 자신의 수행과 노력으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등하다.
우리가 다다르고자 하는 해탈의 길은 상상 이상으로 자유롭고 평등할 것 같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넘치거나 모자랄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북돋우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웃으면서 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