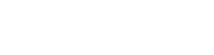뜰앞의 잣나무
페이지 정보
호수 312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11-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11-10 15:02 조회 391회본문
선善의 반대말은 불선不善
동아시아는 불이不二로 설명
한 스님이 조주(趙州)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柏樹子].”
“경계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柏樹子).”
질문한 승려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조주 선사에게 질문하였다. “뜰 앞의 잣나무”라는 대답에 질문한 승려는 아마도 장난처럼 느꼈던 것 같다. 반발하자 조주는 다시 질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정전백수자’였다. 승려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조주의 대답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자 반발한 것이다. 조주는 그것을 알고 마침 뜰 앞의 잣나무를 보고 대답한 것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란 불교의 진리를 묻는 것이다. 질문을 바꾸면 ‘불교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삶이란 무엇인가?’이다. 그런데 ‘뜰 앞의 잣나무’라니! 다시 묻는 말에 조주는 또 “뜰 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대답하였다. 질문한 승려는 조주의 의도를 간파했을까? 간파했으리라 추측한다. 질문한 승려도 오랜 수행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고원(高遠)한 저기에 두고 그것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선문답이 도문 스님과 법륜 스님의 사이에서 있었다. 법륜 스님은 불교 운동과 사회 운동을 하면서 환속하여 재가 법사로서의 삶을 꾸려왔다. 도문 스님은 법륜 스님에게 다시 절에 들어와 생활하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갔다.
스승 도문이 “이제 들어와서 활동해라.”라고 말씀하시자 법륜은 “스님, 도에 무슨 안팎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도에는 안팎이 없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법륜은 “그런데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십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로서의 삶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도문 스님의 대답이 “네가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기지.”였다.
삼조(三祖) 승찬(僧璨, ?~606) 대사의 『신심명(信心銘)』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단막증애 통연명백(但莫憎愛 洞然明白)”, 즉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미워할 뿐이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멈추면 통연하여 밝다.” 개인적으로 단막증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시비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시(是)와 비(非)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시와 비의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시비는 절대적 구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일이고,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시비는 변하기 마련이다.
시비를 구분하되 ‘도덕경’의 말씀처럼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와 같이 하여야 한다. 시비와 선악의 구분은 없어질 수 없다. 시의 입장에서 비를 제거하면 그 내부에서 다시 시와 비의 구분이 따라온다. 시와 비를 초월하는 또 다른 경지는 없다. 선의 대척점에 악을 설정하는데, 악이 제거되면 모든 것이 선으로 꾸려질까? 다시 그 안에 선과 악이 나뉘게 된다. 경계를 뚜렷이 하면 할수록 양쪽에서 다시 구분이 생긴다. 그래서 선의 반대말을 불선(不善)이라고 한다. 선과 불선은 선을 공통분모로 하므로 서로에게 열려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이를 불이(不二)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