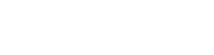하늘의 세계관
페이지 정보
호수 312호 발행인 록경(황보상민) 발간일 2025-11-01 신문면수 12면 카테고리 밀교 서브카테고리 밀교법장담론페이지 정보
필자명 정성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자유기고가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5-11-10 15:13 조회 362회본문
불가사의不可思議 아사리 밀교 홍포
현밀의 온전한 불교가 신라시대 유포
불교문화를 포함해 민족사의 발원에 관한 기초를 다지는 일은 동북공정의 반향으로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작업이다. 얼마간 다룬 상고사와 의례의 관계는 한국 밀교의 연원이 파미르고원에서 출발해 요하 문명, 홍산 문명에 이르는 민족사의 기원과 깊이 닿아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밝힌 것이다.
상고사를 통해 ‘삼국유사’에 조각처럼 전해졌던 신유림과 삼기산의 주술승, 문두루법의 흔적들이 민족문화로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천년 신라불교의 성격을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 가운데 하나를 요약하면 그것은 하늘이었다. 우리 민족에 도달한 최초 불교의 원형은 바로 하늘이었을 것이다. 수천 년간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 거북의 껍질을 태워 한자의 기원인 갑골문자를 개척한 것은 우리 민족이다. 의상은 화엄을 연구해 하늘의 화장세계가 곧 인간의 현실이며, 원효의 <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하늘이었다. 하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늘로 돌아가려던 신앙적 동력은 의상, 원효 같은 성사들의 연구와 수행을 통해 인간 현실과 인간의 심성을 지향하는 종교로 거듭난 것이다.
신라 시대 불가사의(不可思議) 아사리는 생몰이 명확지 않지만, 716년 입당한 선무외(善無畏, 637~735) 삼장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700년 전후 출생한 인물이다. 원효(617~686)나 의상(625~702)의 활동 시기와 불가사의 아사리가 두 성사보다 약간 후대의 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원효와 의상 이후 거의 동시대에 정비된 밀교의 연구와 주석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선무외 삼장이 일행(一行, 683~727)의 도움으로 <대일경> 역경과 더불어 당시 연찬을 모아 <대일경소>를 저술했지만, 선무외 삼장이 손수 <대일경> 제7권을 가지고 입당했기 때문에 불가사의의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의 주석이 <대일경>의 역경보다 다음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확실한 것은 원효와 의상이 현교의 진리를 드러낸 이후 곧이어 불가사의 아사리가 밀교를 홍포하였으니, 현밀의 도리가 일찍이 짝을 이루어 현밀이 온전한 불교가 신라 시대에 유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주 언급한 말이지만 불가사의 아사리는 <대비로자나경공양차제법소>에서, “대저 진리의 지극한 도리는 언어를 떠나고 모양이 없지만 근기에 응해 시현하니 나타내지 못하는 상(相)이 없으며 이른바 아자(阿字) 등의 수행문으로 그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夫眞性至理離言絕像 應機示現無相非顯 所謂阿字等門妙明其理].”라 하였다.
진표 율사(718~ )는 미륵신앙과 몸을 버리는 망신참범(亡身懺法)으로 알려졌지만, 일찍이 순제(順濟)에 출가하여 <점찰선악업보경>과 <공양차제법>을 전수받았다고 하였으니, 불가사의 아사리의 입적은 알 수 없지만, 도당 후 신라에 귀국하여 자신의 주석을 선양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점찰선악업보경>은 사후 업보에 의해 가게 되는 세계를 밝힌 것이고, <공양차제법>은 비로자나 진리 법신을 성취하는 수행문을 주로 설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진표를 유식학승이나 율사로서 보려는 해석이 많지만,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사법을 고려하면 밀교를 선양한 아사리로서 대중교화를 위해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원효, 의상, 불가사의에 의해 민족의 하늘 신앙은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으로 온전히 대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 서거정이 엮은 ‘동문선’ 권 119에는 이색(李穡)이 지은 ‘서천 제납박타 존자 부도명(西天提納薄陁尊者浮圖銘) 병서(幷序)’가 있는데 제납박타 존자는 곧 지공(指空) 화상을 가리킨다. 지공 화상이 천축을 유람할 때 차라박국(哆囉縛國)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불법과 외도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화상이 왕에게 <대장엄공덕보왕경(大莊嚴功德寶王經)> 「마혜사라왕인지품(摩醯莎羅王因地品)」을 보여주었을 때 왕이 칭찬하자 외도의 무리가 해치려 하여 피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지공 화상이 <대승장엄보왕경>의 고본을 패용한 사실로 고려 시대 당시 아시아에 육자진언의 유행 규모가 적지 않았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지공 화상은 선사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경전 패용은 지공 화상이 현밀에 원통한 아사리였다고 평가해도 결코 헛되지 않다.
지공 화상 외 순례기를 남긴 승려의 기록은 외도나 이류의 승려로부터 위협받은 수많은 사례를 전한다. 불법의 진리를 세상에 펴는 것은 인간이 지닌 분별심과 사욕이 만든 거대한 권력과 폭력을 극복하는 험난한 과정이다. 불교는 세계 종교 가운데 연기의 진리를 설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 민족의 기원에서 바라본 하늘의 가치는 홍익인간이다. 불교와 함께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공존을 설하는 평화의 종교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길 바라 마지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